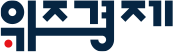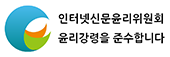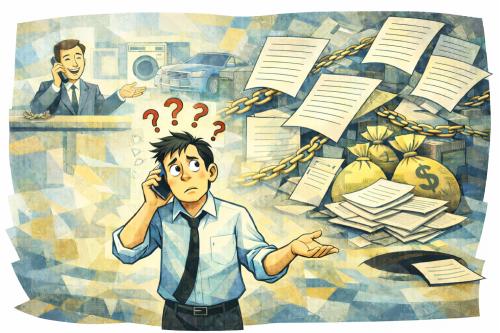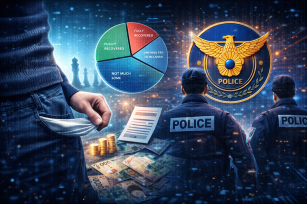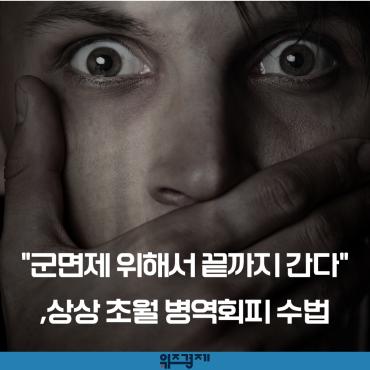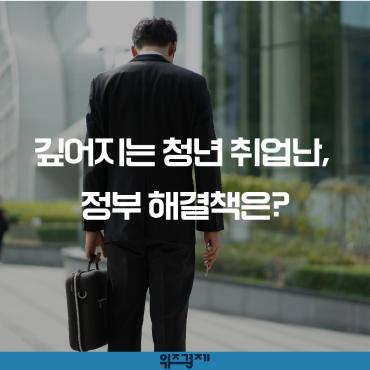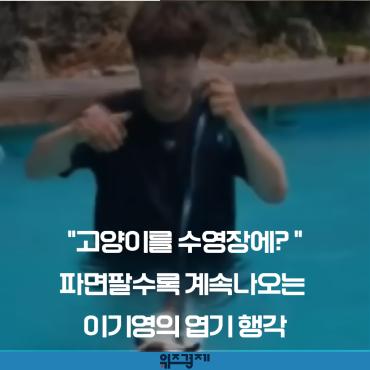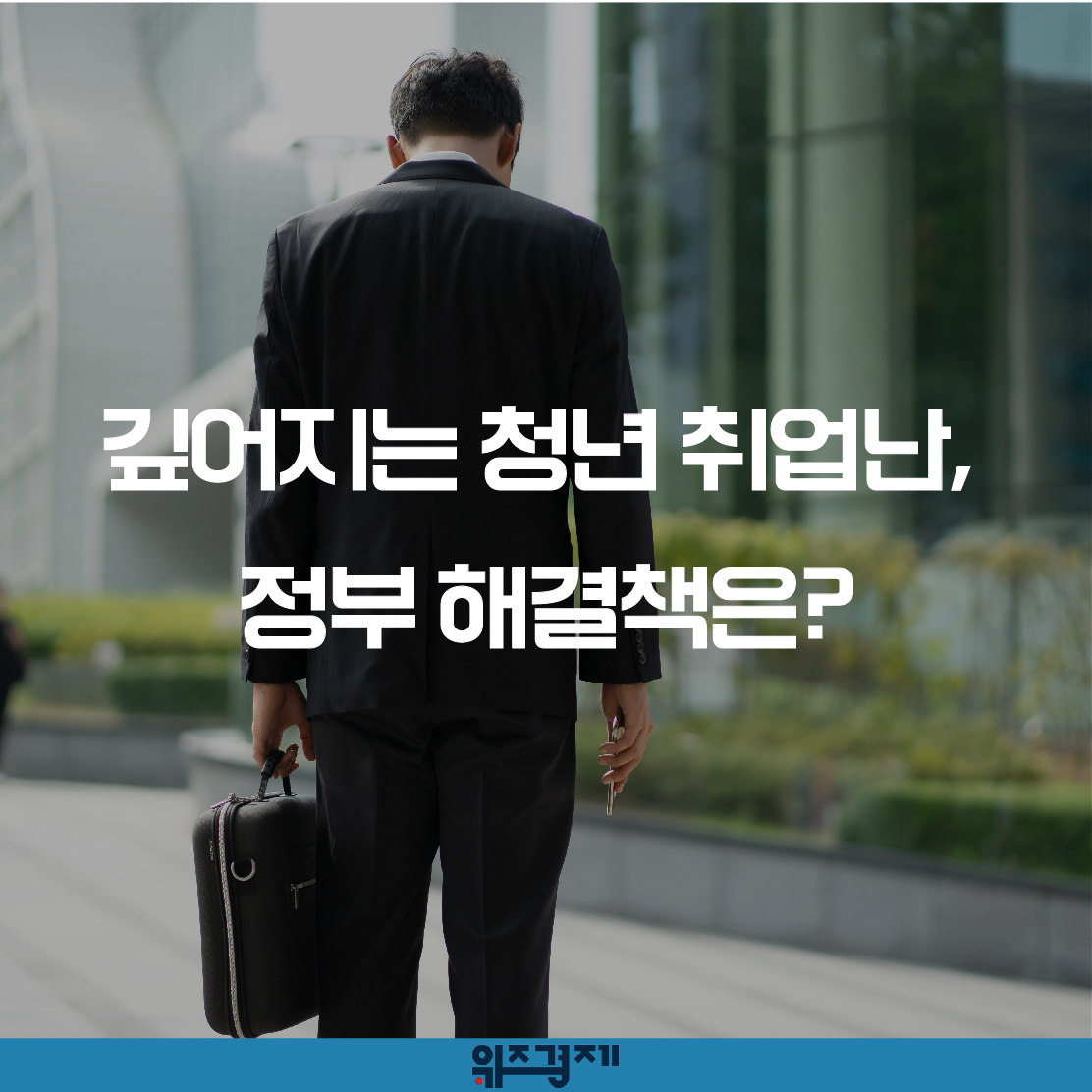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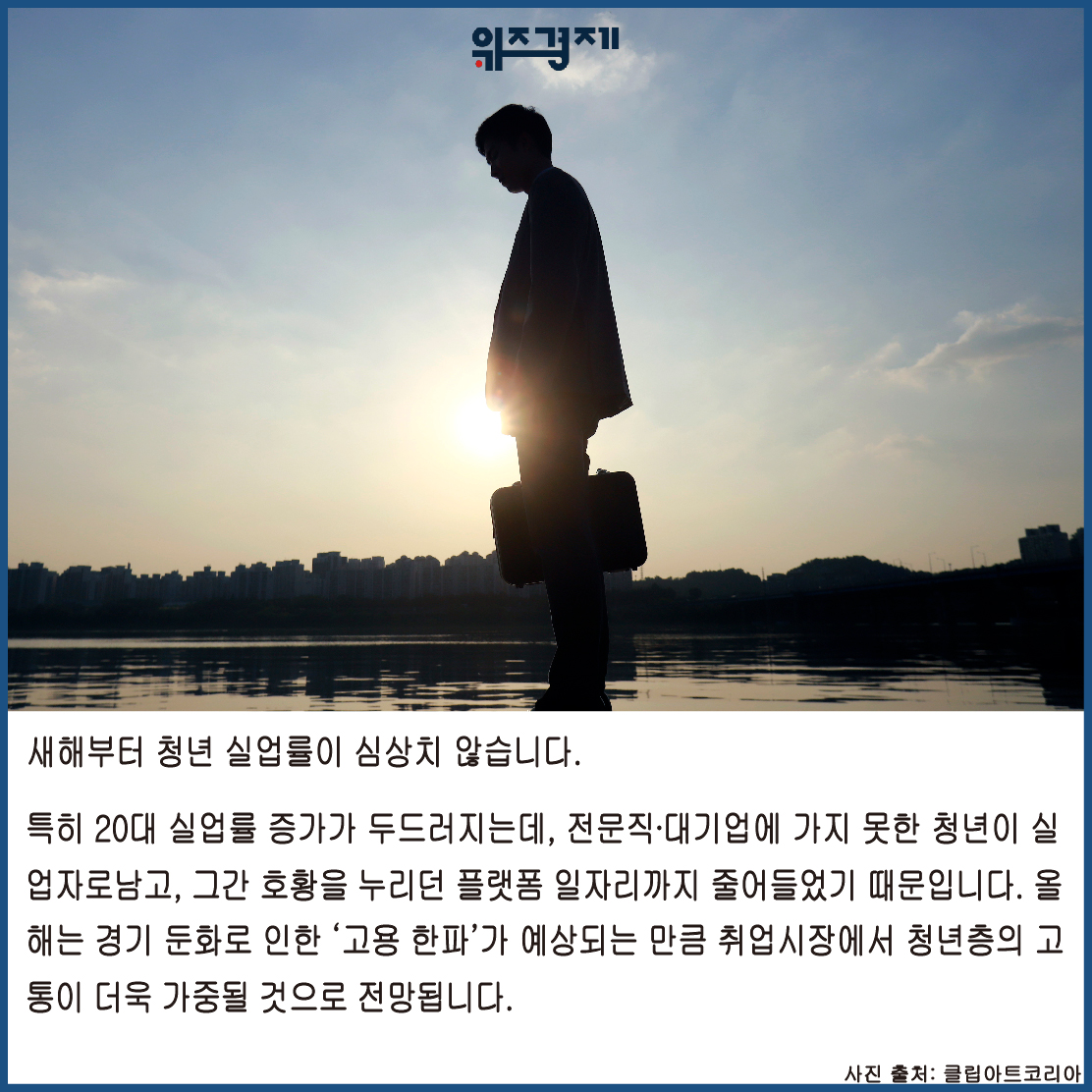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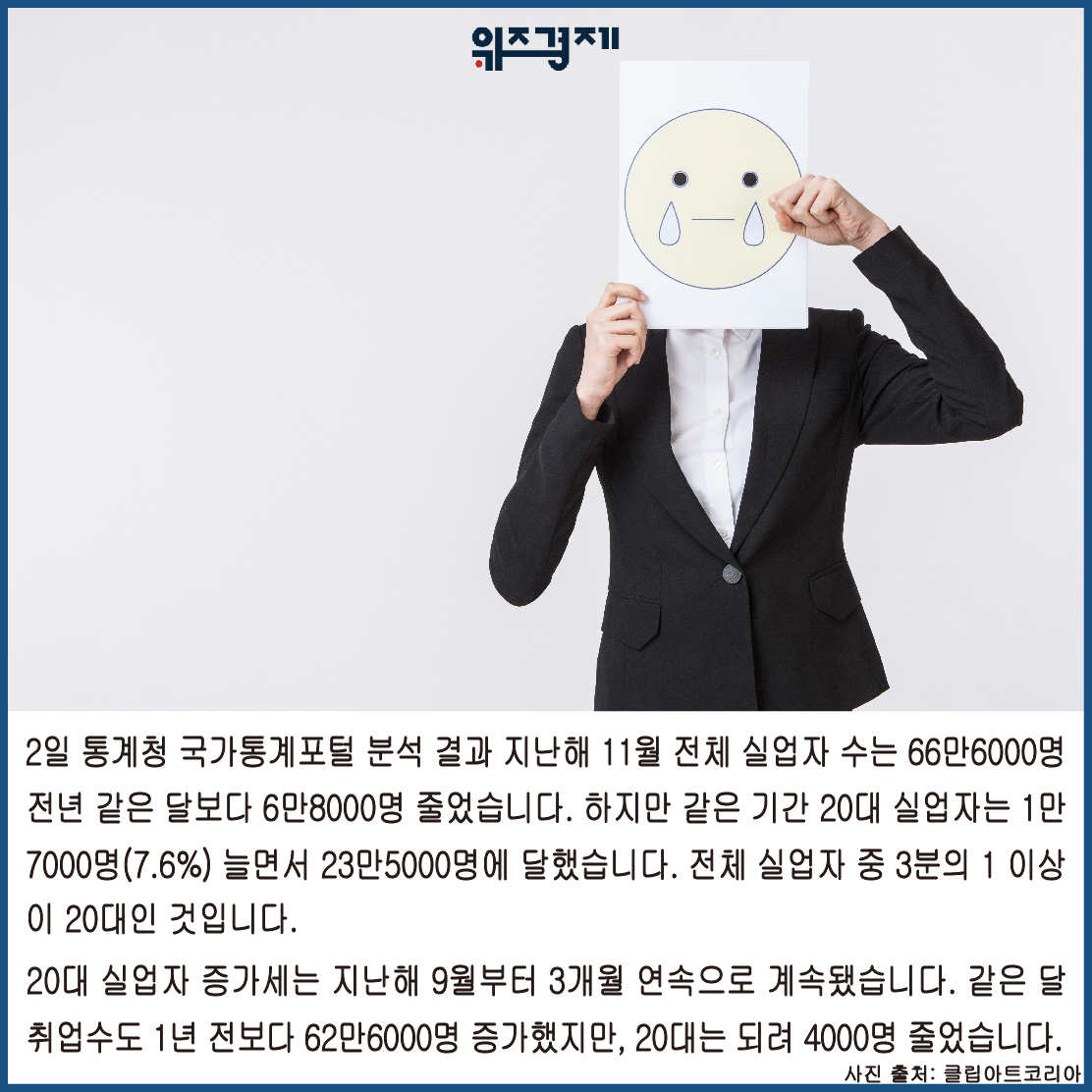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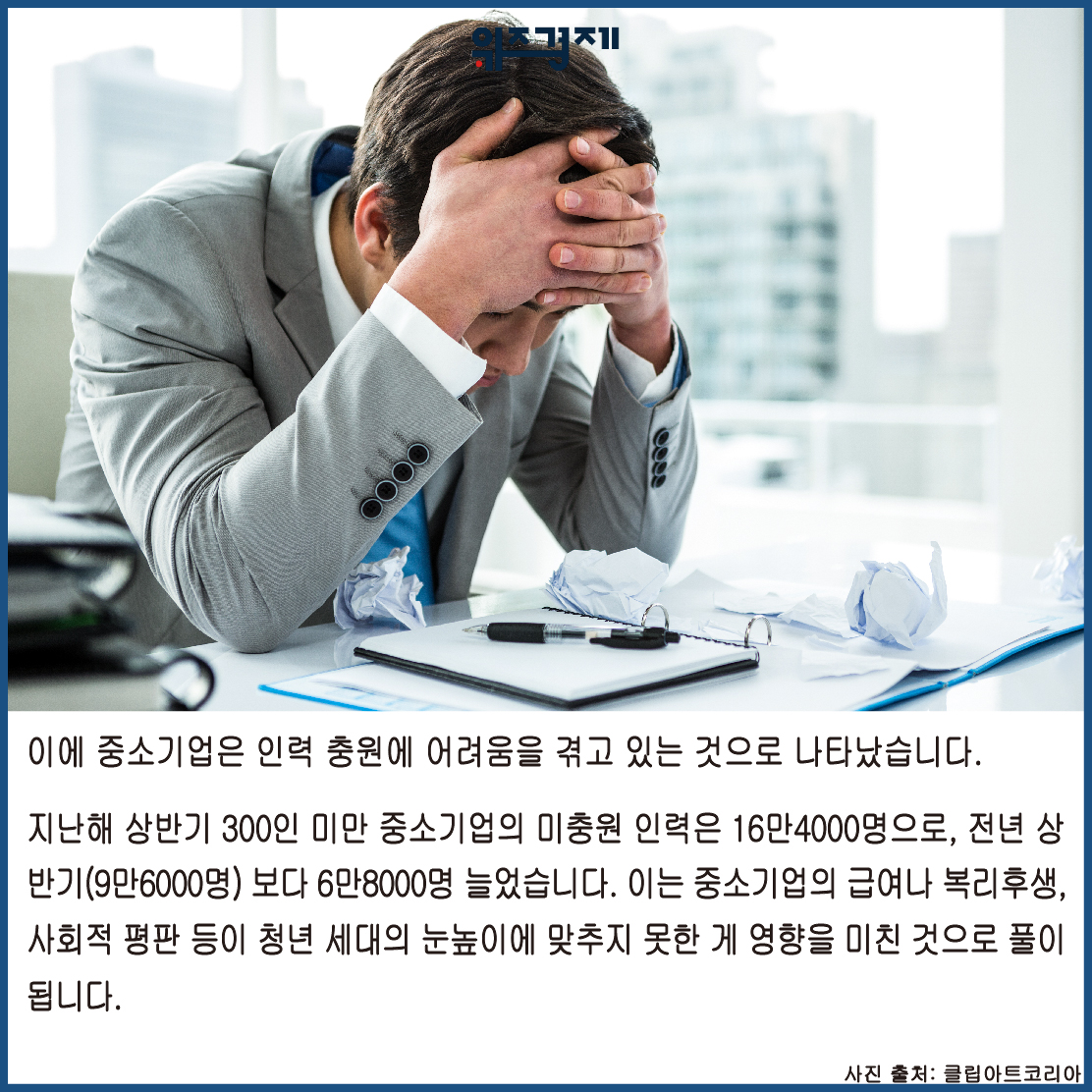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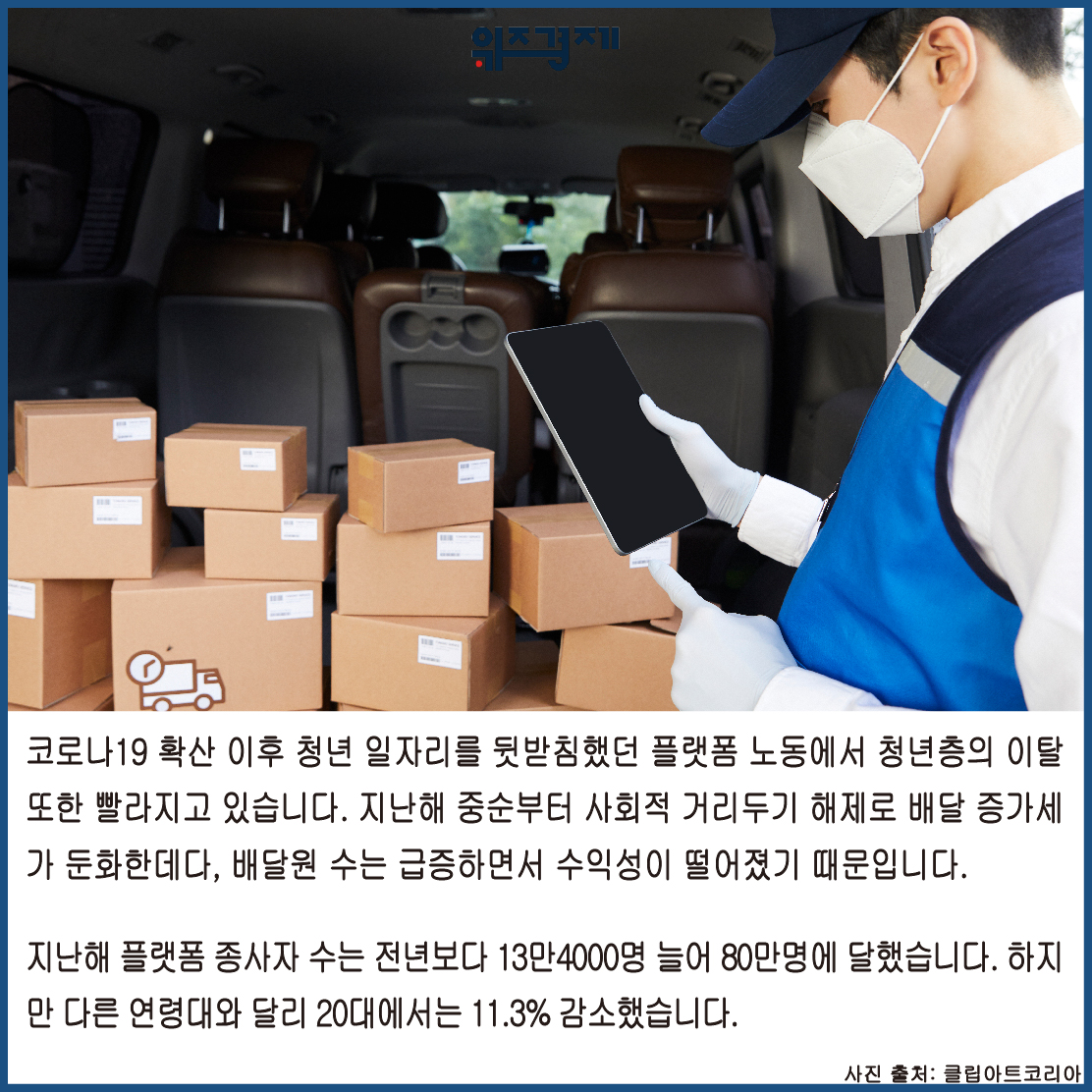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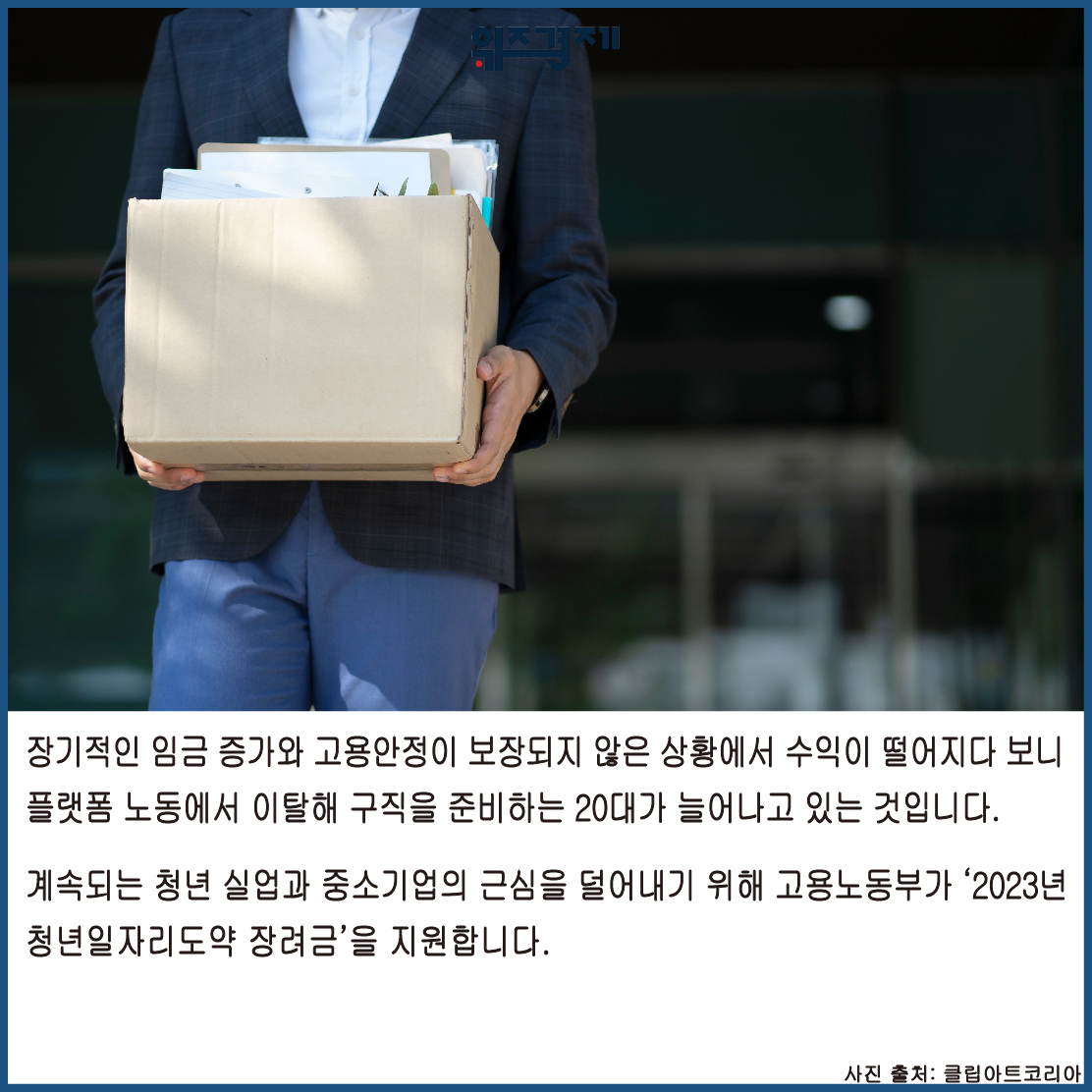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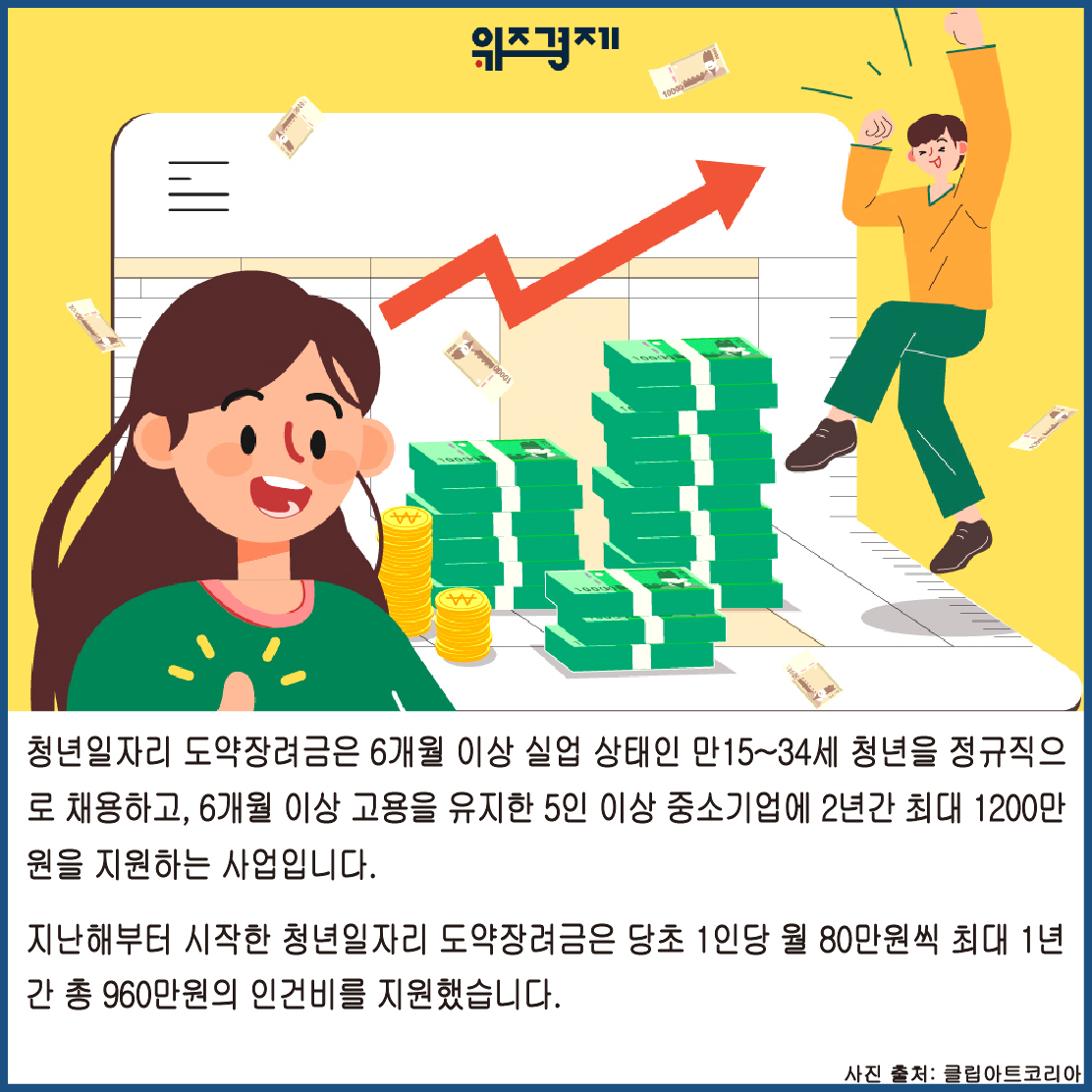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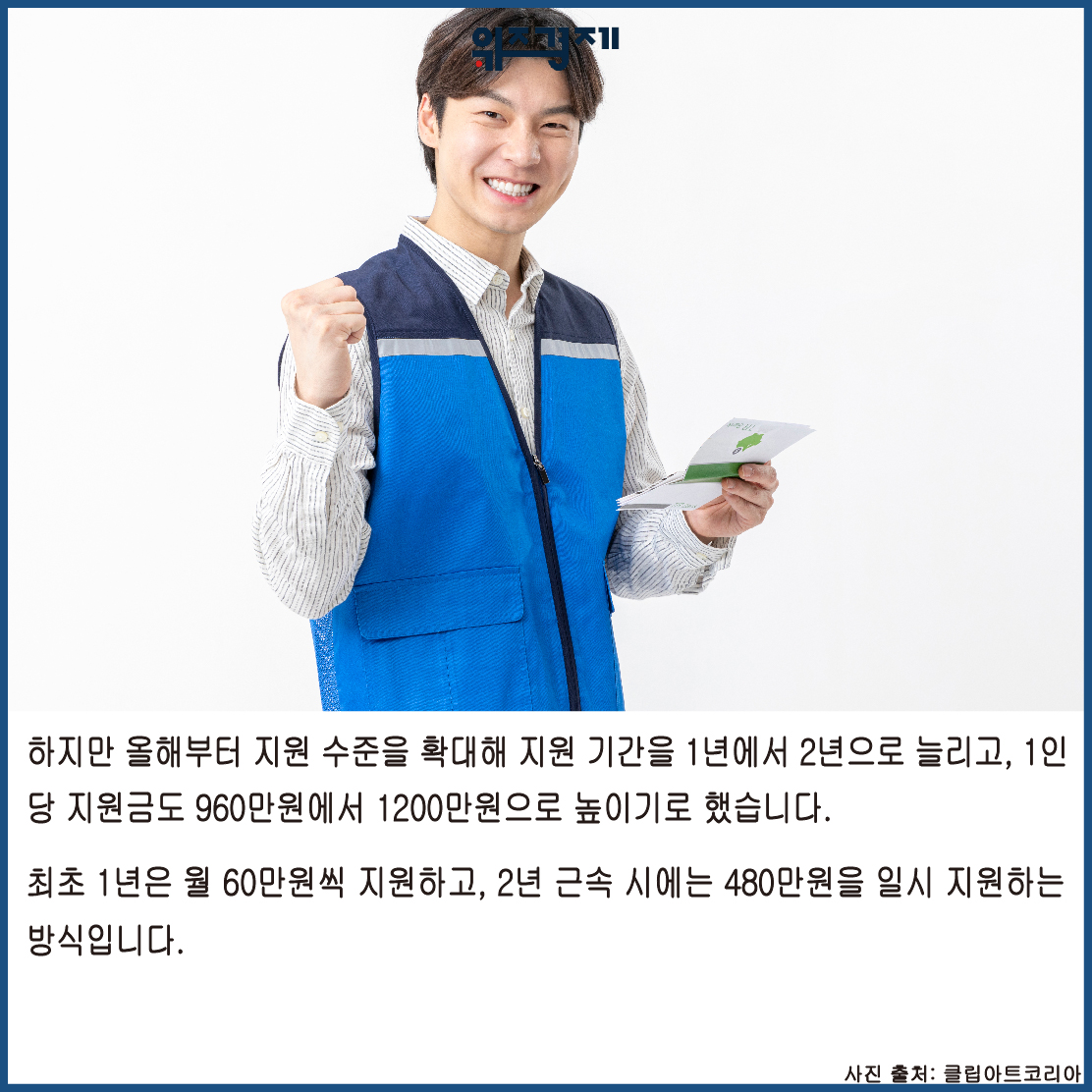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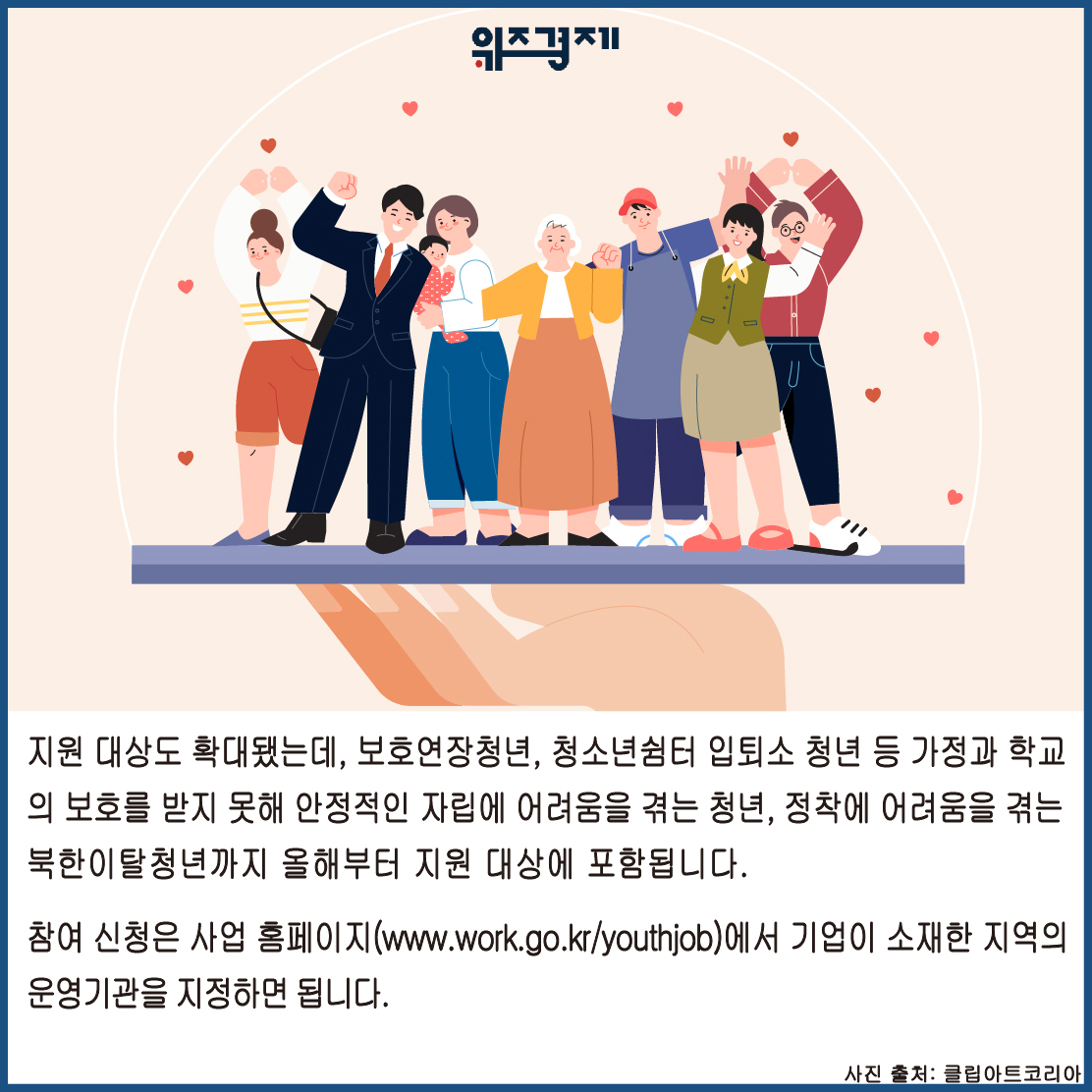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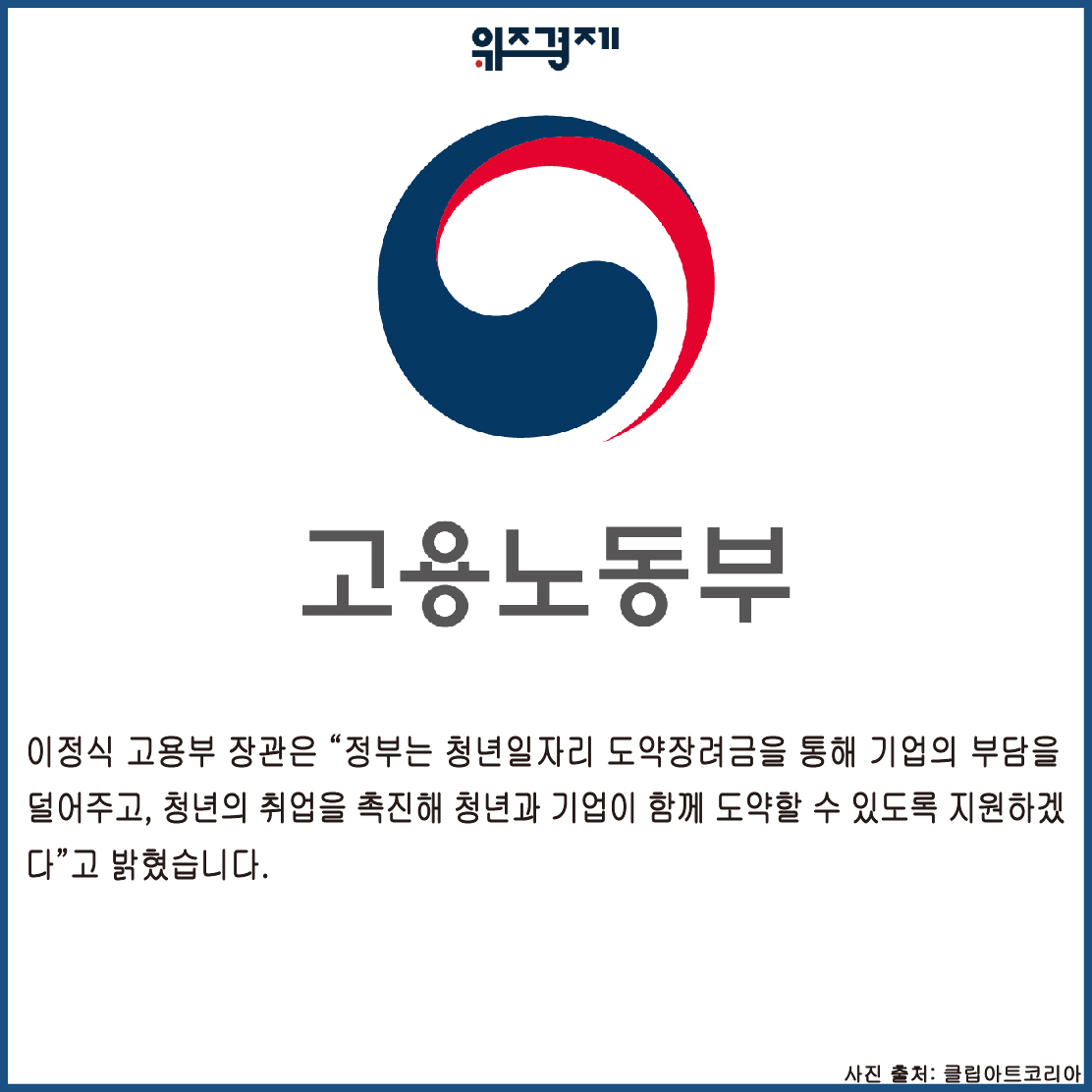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새해부터 청년 실업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20대 실업률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전문직∙대기업에
가지 못한 청년이 실업자로 남고, 그간 호황을 누리던 플랫폼 일자리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취업시장에서 청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 수는 66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만8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대 실업자는 1만7000명(7.6%) 늘면서
23만500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20대인 것입니다.
20대 실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계속됐습니다. 같은 달 취업수도 1년 전보다 62만6000명
증가했지만, 20대는 되려 4000명 줄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16만4000명으로, 전년
상반기(9만6000명)보다
6만8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등이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했던 플랫폼 노동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배달원 수는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플랫폼 노동 이탈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13만4000명 늘어 80만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에서는 11.3%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인 임금 증가와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 플랫폼 노동에서 이탈해 구직을 준비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당초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원 수준을 확대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까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