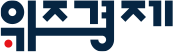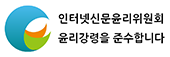귀농·귀촌 인구 감소... 이유와 해법은?
▷지난해 귀농 12.5%·귀촌 15%·귀어 15.9% 감소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 영향"
▷전문가 "연령별 맞춤형 정책 등 관련 정책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감소했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을 막을 수 있을거라 지적합니다.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1만2411가구, 귀촌은 31만8769가구, 귀어는 951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3.5%, 12.3%, 16.2% 감소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도 귀농인 12.5%, 귀촌인 15.0%, 귀어인 15.9%가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가 귀농어·귀촌 인구도 따라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14.7% 감소했습니다. 주택거래량도 49.9% 급락했습니다.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의 이전도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크게 늘어난 1인가구의 귀농어·귀촌 비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75.2%였던 1인 귀농어·귀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7.5%로 2.3%p 상승했습니다. 홀로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늘며 가구수가 늘어도 인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펜데믹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늘어났던 농어촌 유입이, 엔데믹에 가까워지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유입효과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입 인구는 감소했지만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으로 향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2021년 34.4%에서 지난해 37.2%로 오히려 2.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여유자금부족, 농지구입, 주거문제를 힘들어하고 30~40대 귀촌자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60대 이상 귀촌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들을 토로한다"면서 "30~40대 귀농·귀촌자에게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더불어 적절할 자금관련 지원이 필요하고 60대 귀촌자 대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역주민과 융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귀농·귀촌인의 농촌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