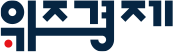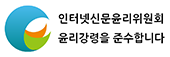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원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A 중견기업 인사당담자는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채용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숙련된 인력확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상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도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해소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세대갈등 될 수 있어...'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이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KDI가 발표한 보고서('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5명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1명 분의 자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경쟁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KDI 한요섭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들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직적으로 증가시켜야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