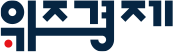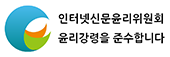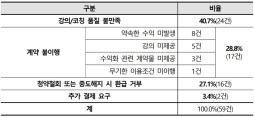펫로스 증후군을 아시나요?
▷오은영 박사 등 유명인들도 펫로스 증후군 겪어
▷상실감과 우울증 겪어...자살 택하는 사람도 있어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과 슬픔 공유하는 것이 좋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상실감, 죄책감,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의 저자 세르주 치코티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남자들은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와 같은, 여자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와 배우 구혜선 등 유명인들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오면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의 애견인구는 2000년 전후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2000년 270만명에 불과했던 애견인구는 22년 만에 1400만명이 넘어 무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0년 전후에 키우기 시작한 애완견은 현재 수명이 다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 유독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하늘로 보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펫로스증후군, 얼마나
힘든가?
반려동물이 죽은 후 반려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따르면 반려견이 죽은 후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1세 여성에게서 '상심 증후군'이 발견됐습니다.
상심증후군은 연인과의 이별이나 가족의 죽음 등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여성들에게 주로 생기는 심인성 심장질환의
일종입니다. 반려동물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연인과의 이별과 가족의 죽음 못지 않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14년 넘게 말티즈를 키웠다는 직장인 A씨는 "키우는 강아지를 잃고 큰 상실감에 빠졌다. 한 동안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밥도 먹지 못했다"면서 "그런 슬픔을 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강아지는 키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증상이 심할 경우 반려동물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복 방법은?
펫로스 증후군은 보통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호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우울이 지속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선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을 인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수명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에게 구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크고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보호자로서 후회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이 수명 자체가
짧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같은 인간끼리도 언제 한 번은 헤어져야 하는데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경험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을 살피듯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