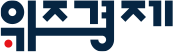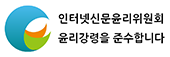캐릭터 챗봇 열풍에 AI 구독까지… 생성형 AI 소비 다변화 조짐
▷챗GPT 독주 속에 신흥 AI챗봇 시장 '다변화' 뚜렷
▷일상으로 파고든 'AI 구독 시대' 열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생성형 AI 챗봇 시장의 대표 주자인 챗GPT(ChatGPT)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 AI 챗봇의 성장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들이 올해 10월 가장 많이 사용한 AI 챗봇 앱은 '챗GPT'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125만 명을 기록했다. 챗GPT는 지난 8월 국내 앱 사용자 수 2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9월과 10월에도 사용자가 소폭 증가해 앱 출시 후 매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어 제타 앱이 336만 명의 MAU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뤼튼 221만 명, 에이닷 188만 명, 퍼플렉시티(Perplexity) 171만 명, 크랙 97만 명, 그록(Grok) AI 91만 명, 다글로 62만 명, 클로드(Claude) 46만 명, 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42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챗GPT', '크랙', '그록 AI', '클로드' 등은 앱 출시 이후 MAU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사용시간별로 살펴보면, 지난 10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AI 챗봇 앱은 '제타'가 7326만 시간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챗GPT가 4828만 시간으로 2위, 크랙은 898만 시간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그록 AI 195만 시간, 채티 183만 시간, 퍼플렉시티 157만 시간, 뤼튼 142만 시간, 다글로 120만 시간, 클로드 70만 시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 33만 시간 순이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캐릭터의 성격, 말투, 외모 등을 설정해 자신만의 AI 챗봇을 만들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캐릭터 기반 AI 챗봇 앱'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캐릭터 기반 AI 챗봇 앱인 제타, 크랙, 채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제타는 챗GPT 대비 높은 사용시간을 기록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록 AI 또한 캐릭터 챗봇 기능과 비디오 생성 기능 도입 이후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기능이 성인용 콘텐츠 생성도 허용하고 있어 '선정성 및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제는 일상화된 'AI 구독' 시대
생성형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네이버 등과 나란히 주요 구독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챗GPT 유료 구독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유튜브와 네이버 등과 함께 주요 구독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인구 대비로는 사실상 전 세계 1위 수준의 생성형 AI 활용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20대 26.1%, 40대 19.3%, 50대 11.8%, 60대 이상 3.4%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대별 이용 건수 증가율로 봤을 때는 20대 이하가 253%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성별 비중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초 7:3으로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6:4까지 좁혀지며 여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초기에는 AI구독이 남성 중심의 '얼리 어답터형 소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대중적인 구독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목적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10대는 '과제', '수행평가', '고민상담', 'AI채팅'처럼 학업과 일상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는 '자소서', '논문', '과제' 등 학업 중심의 검색 비중이 두드러졌다.
또한 1020대 모두 과제에 AI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면서, 'GPT 킬더' 등 AI를 사용한 티가 나지 않게 검사해주는 툴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는 '사주', '주식', '로또' 등 정답이 없는 선택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40대는 '영어회화', '그림', '엑셀', '번역'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법', '뜻', '학원' 등의 키워드가 확인돼 AI를 배우고 익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생성형 AI 서비스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생성형 AI 서비스를 1개 구독한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했으며, 2개 이상 구독한 비율은 이보다 약 2배 수준인 27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개 이상 복수 구독자는 30~4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 20대 대비 구독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장기 구독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정기 구독 유형별 이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구독자 중 1회성 구독에 그치는 이용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3% 증가한 반면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독을 이어가는 고객의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반기 내 4개월 이상 장기 구독자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1%에 달해, 단발성 구독자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한 체험 중심 소비 흐름을 넘어,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구독 문화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