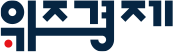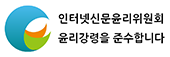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언어폭력 37.1% 가장 많아”
▷올해 초∙중∙고생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피해유형 '언어폭력' 비율 가장 높아...'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뒤이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생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5월 10일 초4~고3 학생 317만명(전체 384만명 중 82.6%)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천명)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때 집계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차 조사 대비 0.2%p,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0.1%p, 중학교는
0.4p 올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6.9%)의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14.6%->17.3%) 비중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피해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18.2%)의 비중이 컸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피해 비중이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역시 30.5%에 달하는 등 같은 학교 동급생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8%, ‘학교 밖’이 27.3%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이 29.0%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으며,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7.6%였습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교내에서 생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보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해 총 2천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15명씩 배치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