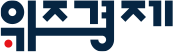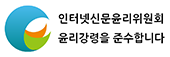지난해 상속세 공제 금액 8,300억 육박... "역대 최대 규모"
▷ 지난해 상속세 공제 받은 가업 188곳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라는 상속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재산의 전부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길게 운영할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감면 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속세를 공제받은 가업은 188개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규모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제받은 금액 역시 총 8,37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4배 불어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2019년~2021년의 평균(101건)보다 66.3%나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보다
76.3%나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23년 사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감면에 대한 중견,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수요가 높다는 뜻인데요.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긴 후, 3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건데요. 결정세액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9배 가량 증가한 12.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18,282명으로,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원과 상속재산이 2022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42.9%)입니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원 ~ 500억 원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34.1%)에 달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건물이 18.5조
원, 토지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비중의 68.8%를 구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