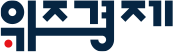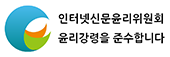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판매 저성장’ 자동차업계가 로봇으로 갈아탄다…테슬라 ‘엔비디아세’ 회피, 현대차 ‘2등 경쟁’의 변수
▷완성차 판매 둔화로 주가 견인력 약화…SDV·로보택시·로보틱스가 새 성장 스토리로 부상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관문은 ‘2만 달러’…추론비용 줄이는 내재화가 승부처로 떠올라
▷로봇 테마 과열 경고도…데이터·안전·표준·공급망까지 ‘현실 전략’ 없으면 거품만 남는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자동차 업계의 성장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가 정체 국면에 진입하며 실적만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시대가 저물고, 그 빈자리를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로보택시, 로보틱스, AAM(도심항공모빌리티) 같은 ‘확장 스토리’가 채우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 현대차·기아의 합산 도매판매가 전년 대비 -1%에 그친 흐름은 이러한 전환을 상징한다. 2026년 판매 목표치 역시 3% 수준으로 제시되면서, 단순 물량 성장으로는 기업 가치(Valuation)를 재평가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지역별 판매 데이터는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현대차의 12월 글로벌 판매량은 32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북미 시장은 9만 대(+1%)로 선방했으나 유럽은 4만 3천 대(-16%)로 급락했으며, 인도는 보합세(0%)를 보였다. 기아 또한 23만 6천 대(-2%)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미국 양호, 유럽 부진’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라인업 확대와 신공장 가동만으로는 시장 정체를 돌파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2만 달러의 벽과 ‘엔비디아세(稅)’ 회피 전략
이런 배경 속에서 로봇은 자동차 산업의 차세대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로봇 시장이 자동차 산업의 2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산업 노동인구의 20% 대체와 ‘1가구 1로봇’ 시대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으로 밸류체인이 분절되는 과정에서, 미국 진영에 접근 가능한 한국의 제조 공급망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로봇 테마 과열에 따른 ‘버블성’ 주가 상승과 향후 옥석 가리기에 대한 경고도 적지 않다.
로봇 상용화의 진정한 관문은 기술 시연이 아닌 ‘단위 경제성’ 확보에 있다.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려면 대당 판매가가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문제는 현재 대다수 제조사가 엔비디아 GPU와 클라우드 API에 의존하고 있어, 로봇이 구동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초기 하드웨어 비용(CAPEX)뿐 아니라 운영비(OPEX)까지 외부 벤더에 지불해야 하는 이른바 ‘엔비디아세(Nvidia Tax)’와 ‘지능 통행세’가 수익성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테슬라의 독주 체제와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
이 관점에서 테슬라는 ‘엔비디아세가 없는 유일한 피지컬 AI’로 평가받는다. 자체 추론 칩(AI5), 배터리,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해 변동비를 극단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셋 모듈 원가가 대당 1,000~2,000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테슬라의 자체 설계 칩은 300~5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100만대 양산을 가정할 경우, 칩 비용에서만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이익 격차가 벌어진다. 외부 클라우드 호출을 줄이고 온디바이스 추론을 강화할수록 테슬라의 구조적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테슬라의 로보틱스는 ‘기계 판매’를 넘어선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2030년 연간 100만 대 판매 시나리오에 따르면, 하드웨어 가격은 2만 달러 수준까지 낮아지지만 대당 연 3,000달러의 구독 매출(RaaS)이 이를 보전하게 된다. 하드웨어 영업이익률은 7%에 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이익률은 80%에 달해, 전체 로보틱스 영업이익의 약 69%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즉, 로봇 설치 기반이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구독 모델로 재정의되는 것이다.
◇현대차의 ‘2등 경쟁’과 현실적 장벽들
물론 로봇 산업의 연착륙에는 여전히 물리적 장벽이 존재한다.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가격 외에도 안전, 책임 소재, 유지보수, 데이터 확보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현장 동작 데이터는 웹상의 텍스트 데이터와 달리 수집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자본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의 장벽’ 때문에 실험실의 데모 영상과 실제 현장 투입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며, 이는 주가가 실질적 성과보다 앞서나가는 ‘오버슈팅’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현대차그룹은 ‘비테슬라 진영’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계열사 공장과 물류 현장이라는 거대한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 수요와 실전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구글 딥마인드의 인지 모델과 TRI의 운동 제어 기술 등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있다. 다만 미국 진영의 공급망 합류와 중국의 저가 공세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세 가지 생존 전략
자동차 산업이 로봇으로 확장하는 길은 열렸지만, 거품 없는 실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DS증권이 발간한 ‘휴머노이드는 로봇이 아니다 #3’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기업은 ‘제조 확대’보다 로봇의 총소유비용(TCO) 절감에 전략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자체 칩 내재화와 전력 효율 개선으로 외부 기술 종속을 줄여야 휴머노이드 가격을 2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경쟁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정부는 보조금 중심 지원보다 표준화와 안전 규칙 선점에 나서야 한다. 사고 책임 구조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로봇 확산이 혁신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투자 시장은 단순 ‘테마’와 실질적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로봇 키워드를 내건 기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반복 운용이 가능하고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 구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갖춘 업체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로봇 산업의 승부가 화려한 시연 영상이 아니라 ‘원가·데이터·책임’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서를 먼저 맞추는 기업에서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 4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