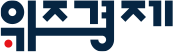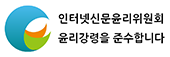윤 정부, ‘재정준칙’ 도입방안 확정…국회 통과는 ‘글쎄’
▷추경호 부총리, "건전한 재정은 경제운용의 첫 단추"
▷정부, 재정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관리
▷야당 동의가 변수…”국가 재정 축소 막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나라살림의 건정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몇 년 간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재정준칙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건정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보다 엄격한 기준…2024년부터
적용
재정준칙은 나람살림의 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정해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은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리 -3%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윤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 살림을 의미합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인 셈입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즉시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음 번 본예산인 2024년부터
예산안이 적용됩니다.
#야당 동의 없인 도입 어려워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로 동의를 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가 더 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에도 당내 찬반 의견이 대립했고,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